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증(Functional dyspepsi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소화불량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기질적 요인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배제한 소화불량증을 말합니다.
즉, 소화성 궤양이나 위식도 역류질환, 위암, 췌담도 질환, 알코올, 복용 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화불량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질적 요인을 제외한 소화불량을 기능적 소화불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정의 |
소화불량증은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상복부 중앙에 복통이 나타나거나 불편감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식사 여부와는 크게 관계 없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불편감은 대개 조기포만감, 상복부팽만감, 구역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식사를 했을 때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생길수도 있고, 안생길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편,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염, 만성 위염, 위하수증 등으로 통용하여 불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명칭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 2.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진단기준(Rome Criteria Ⅳ) |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 6개월 이전부터 증상이 시작하여 3개월동안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2) 식후 포만감, 조기 만복감, 상복부 통증, 상복부 쓰림의 증상이 1가지 이상 있는 경우
3) 기질적인 질환은 배제: 병력청취 및 내시경 검사 등으로 배제
4) 증상의 호전과 악화 시 배변 관련 증상 및 배변 습관이 변하지 않아야 함
| 3.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 |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도 연구 중에 있으며, 여러가지 가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위, 십이지장의 운동장애'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십이지장의 운동장애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주원인으로 보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약 25~60%정도가 위 배출 시간이 지연되거나 식후에 위장의 전정부 운동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가설의 한계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음식을 먹었는데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위산분비'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경우 위산분비가 정상인보다 많이 발생되어 통증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가설로,
현재는 여러 연구를 통해 정상인과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위산분비의 양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내장감각역치'를 원인이라 보는 것입니다.
내장감각의 역치값이 변화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인데,
정상인의 경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 내 압력이 증가하고,
위 내 압력의 증가는 위역치 용적을 증가시키는 적응 과정을 발생시킵니다.
위 용적이 증가하면 음식을 수용가능하게 되면서 동시에 십이지장으로 배출을 촉진합니다.
정상적인 소화과정인 것이지요.
그러나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경우는 위 역치 용적이 적은 상태로,
음식 섭취를 적게 하였더라도 위장의 부피가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여
팽만감이 발생하고, 상복부의 불편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십이지장으로의 배출 역시 더뎌지게 되어 증상을 반복하게 되구요.
특히, 지방식이가 포도당 식이보다 더 내장과민성을 증가시키고,
위 운동을 저하시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증상을 더욱 유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신적 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기능성 소화불량의 아형(Subtype) |
기능성 소화불량은 증상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복부 불쾌감을 주증상으로 보는 형태로 식후불쾌감증후군(Postprandial distress syndrome, PDS)이 있습니다.
둘째, 상복부의 통증을 주증상으로 보는 형태로 상복부동통증후군(Epigastric pain syndrome, EPS)이 있습니다.
셋째, 상복부 불쾌감과 통증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PDS/EPS 중복군이라고 합니다.
침고로 우리나라는 PDS와 PDS/EPS 중복군이 많은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 5. 기능성 소화불량의 약물 치료 |
기능성 소화불량의 약물치료는 PDS인가, EPS인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1) PDS(Postprandial Distress Syndrome)
PDS의 경우 우선적으로 위장운동촉진제를 활용합니다.
위장운동 촉진제는 도파민 D2 receptor antagonist와 5-H4 receptor agonist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도파민 D2 receptor antagonist는 도파민 D2 수용체에 대한 길항제로 'metoclopramide, levosulpiride, domperidone'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 약물은 근육긴장 이상증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5일 이내로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5-H4 receptor agonist는 5-H4 수용체의 작용제로 mesapride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위장운동촉진제에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추가할수도,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PI 약물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어 활용이 권고되고 있는데,
다만, PPI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화불량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2019년 기준)
위장운동 촉진제를 활용하여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Fundic relaxant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Buspirone이 있는데, 5-H1에 대한 수용체 agonist로 위 기저부를 이완시켜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2) EPS(Epigastric Pain Syndrome)
EPS는 1차적으로 PPI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장운동촉진제를 가감하게 되구요.
이 약물을 복용하였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TCA(삼환계 항우울제, Tricyclic antidepressants) 혹은 항우울제(mirtazapine)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TCA의 사용과 항우울제의 사용이 효과적인 논문이 여러차례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TCA의 경우 과민성 장 증후군의 치료지침에도 활용이 권고되며,
nortriptyline, desipramine 등의 약물이 해당됩니다.
다만, TCA와 mirtazapine의 경우는 정신과 질환의 약으로 1차적 치료 약물로 사용하지 않으며,
복용 기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6. 식이 및 생활습관 교정 |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 대한 식이 및 생활습관 교정은 소화불량과 거의 유사합니다.
음주, 흡연, 커피를 가능하면 피해야 하고
소화기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매운음식, 고지방식이, 유제품, 밀가루음식, 탄산음료 등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생강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를 먹는 것이 좋겠네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들이긴 한데, 부연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매운 음식은 캡사이신에 대한 반응 때문인데, 캡사이신이 인체 내에서 TRPV1 수용체를 활성화하게 되어 작열감이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매운 음식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은 TRPV1 수용체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매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수용체에 대한 반응이 탈감작화하게 되어 수용체에 대한 역치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매운 음식에 적응하게 되어 작열감과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경우 이 역치값이 낮게 되어 과민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자극이 되어 통증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생강을 권하는 이유는 생강이 위 전정부의 수축을 유도하고 위 내 음식물의 배출을 촉진시켜 포만감을 감소하게 됩니다.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열 반응을 유도하여 인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생강차의 복용은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tea)는 차의 성분 중 Theophylline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대한 길항제의 역할을 합니다.
아데노신이 명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Theophylline이 작용을 억제하여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 오정환, 권중구, "기능성 소화불량증", 2019, Korean J Gastroenterol Vol. 73 No. 2
[2] 박종규 외 7인,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최근 동향", 2014, Korean J Gastroenterol Vol. 64 No. 3
[3] 신철민, "기능성 위장관질환에 있어서 식이 및 영양요법", 2016, 대한내과학회기 제 90권 제 2호
'질환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학 상식_말초성 안면신경마비(feat. 구안와사) (0) | 2022.05.19 |
|---|---|
| 의학 상식_갑상선기능항진증(feat. 그레이브스병) (0) | 2022.05.17 |
| 내과 질환_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과 치료 (0) | 2021.02.20 |
| 피부과 질환_발바닥의 '굳은살'은 '티눈'일까, '사마귀'일까? (0) | 2021.02.14 |
| 의학 기타_방아쇠수지증후군(Trigger finger Syn) (0) | 2020.12.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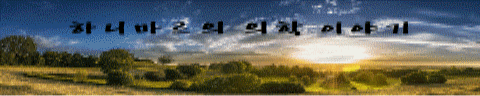





댓글 영역